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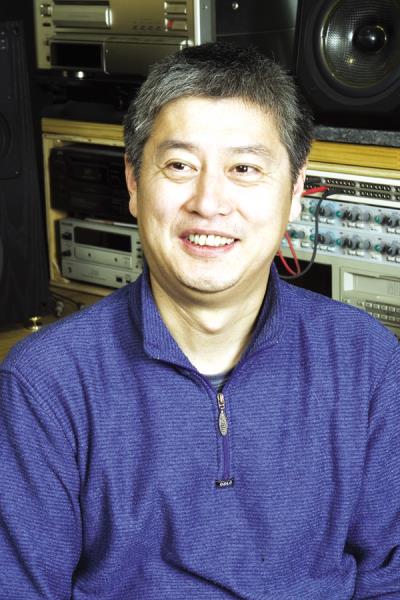
시간의 바다를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2학년, 나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산 내셔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듣고 있다. 그 조그만 라디오와 내 귀를 연결하는 예쁜 이어폰은 그날 밤도 어김없이 나와 그들을 연결해 준다. 카펜터즈, 송창식, 비틀즈. 마마스 앤 파파스, 김정호…. 그들과 만나는 그 호젓한 밤들을 불과 며칠 만에 밤손님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나와 첫 오디오는 이별을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잠실 1단지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무렵, 우리 집에 전축이 들어 왔다. 라디오 창엔 초록 빨강 불이 반짝거리고, 볼륨을 반만 올려도 가슴을 쿵쿵거리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친구들을 납작한 원반으로 간직하게 해준 별표 전축이다. 당시 친구 집엔 독수리표 전축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우리 전축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별이 독수리만 못한 것 같았다. 또 다른 친구 집에 있던 산수이 전축은 더욱 확연한 차이로 별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재수생 때, 음악다방을 하던 친척 집엔 마란츠 리시버, 듀얼 턴테이블, AR 스피커가 넓은 홀에서 노래하고 있고, DJ를 보던 형과 영업 끝난 다방에서 듣던, 도나 섬머, 비지스, 이글스, 올리비아 뉴튼 존, 린다 론스타드, 어스 윈드 앤 파이어……. 지금은 많이들 늙었겠지. 대학 때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나의 첫 녹음기 소니 워크맨과 만나기도 하고, 나의 집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1984년 뉴욕, 처음 월부로 마련한 마란츠 컴포넌트 시스템은 아무리 하여도 재수시절 그 다방에서 듣던 마란츠와 AR 형제가 내는 노랫소리에 못 미친다. 스피커를 바꿔본다. 우리 동네 개라지 세일에서 5달러 주고 산 조그만 고물 AR 스피커, 내 마란츠가 노래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저음이 어디 갔지? 내친 김에 맨해튼 오디오 가게에서 세일하는 키 커다란 AR을 500달러나 주고 샀다. 한쪽 트위터에 이상이 있어 다시 그 가게에 가 보니 하나에 500달러짜리를 한 쌍에 500달러에 판, 그 점원이 직업을 잃었다 한다. 뉴욕에서 서울로 돌아오기 전까지, 내 마란츠와 12인치 우퍼가 둘이나 달린 키 큰 AR 스피커는 계속 노래했다.
1988년 서울로 돌아 온 나는 본격적으로 오디오를 한다. 세검정엔 조그마한 녹음 스튜디오를 열고, 집에는 여러 가지 앰프와 스피커들이 들락날락하고, 그 즈음, 충무로에서 셀레스천 스피커와 만난다. 불룩 나온 배 위에 예쁘고 네모난 머리를 얹은 시스템 6000이다. 당시의 내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상대였다. 내게 많은 오디오 이야기를 들려주던 잡지, 스테레오파일 중고 장터에 보스턴 근교, 어느 오디오 가게에 시스템 6000이 아름다운 가격으로 나왔단다. 마침 뉴욕에 다니러 간 나는 천신만고 끝에 보스턴의 그녀를 우리 집 안방으로 공수하는 데 성공한다. 서브우퍼와 셀레스천 600의 결합체인 시스템 6000에 내 앰프를 물려 본다. 우퍼에는 녹음실에서 쓰던 야마하 앰프, 셀레스천 600에는 애드컴 555 앰프를. 보스턴 그 가게에서 듣던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셀레스천은 프로악 리스폰스 3에 자리를 내주고, 250W를 자랑하는 일렉트로 컴패니 앰프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짝이었다. 그리고 몇몇 시스템을 거쳐 나는 다시 6000이 그리워졌다. 나는 12인치 더블 우퍼가 내는 저음이 그리웠었나 보다. 시간이 흘러 지금 쓰고 있는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와 만났다. 12인치 더블 우퍼다. 플리니우스 앰프와 짝을 맞춰본다. 상상했던 소리가 나지 않는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다.

오디오 여행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간략하게 요약해 본 제 오디오 여행담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실수를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오디오를 하며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음악을 음악으로 듣지 못하고 소리로 듣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둔해지는 감수성을 기계의 무게로 보상이나 하려는 듯이 갖고 있는 오디오 기기들의 무게의 합은 점점 늘어만 가고, 그 무게와 반비례하여 음악 소리는 점점 줄어만 가고, 결국에는 앰프나 스피커는 음악을 듣는 장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도 들기 전에 차갑게 떠나보낸 많은 기기들입니다. 특히, 어떤 스피커들은 오래 들어야 그것들이 갖고 있는 진면목을 발휘하는데 말입니다. 오디오를 하는 것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어떤 여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기 용산이나 청계천 구석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그 여인 말입니다.

요즈음에는 얼마 전에 우리 집으로 이사 온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 1과 밀월 중입니다. 귀를 간질이는 봄볕 같은 고음과 원래 갖고 있는 자연스런 소리를 내주는 중음, 그리고 몸으로 전해지는 충분한 저음을 내줄 것 같은 스피커입니다. 현재 플리니우스 SA-100 앰프로 울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드라 스피커를 충분하게 울리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가 조금 고역 쪽으로 치우쳐 있는 듯하여, 스피커 케이블을 바꾸고, CD 플레이어를 바꾸어 보았지만 아직 밸런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플리니우스 앰프가 한 대 더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모노 브릿지로 하여 안드라를 울려 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흡족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힘 좋은 고출력 진공관 앰프를 물려 보겠지요. 아직 울려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쉽게 자신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 스피커입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여 제 소리로 노래하게 되면, 또 다른 목소리로 노래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오디오를 하는 것은 계속 산으로 오르기만 하는 것인가 봅니다. 봉우리도 없는 산으로 말입니다.
아침에 듣는 음악과 저녁에 듣는 음악은 다릅니다. 운전하며 듣는 음악이 훌륭한 오디오 시스템으로 듣는 음악보다 못 하지도 않습니다. 소리는 귀로 들어 오지만 노래는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는 앰프를 뜨겁게 달구어 또 음악을 듣습니다. 내 마음을 더욱 세게 울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직 저음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강승원 씨의 시스템
스피커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 1, 토템 마니 2, 레퍼런스 3a 마스터 컨트롤, 프로악 타블렛 3 시그너처, 제네렉 30SC(스튜디오 모니터)
프리앰프 플리니우스 12, 소닉 프론티어즈 SFL-2, 아라곤 24K
파워 앰프 플리니우스 SA-100, 오디오 리서치 클래식 60, 아라곤 4004
인티앰프 YBA 인테그라 델타 DT CD 플레이어 YBA Lecteur CD3 델타, 레가 플래닛
CD 레코더 파이오니아 RDP-1000 D/A 컨버터 메리디언 563 DVD 플레이어 소니 9000ES



